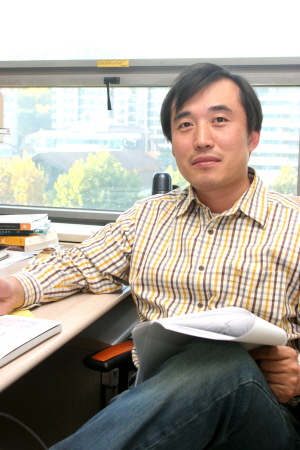
EBS의 메디컬 다큐멘터리 <명의> 제작팀이 같은 이름의 책을 발간했다. <명의>는 환자의 투병이나 질병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의학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질병 치료를 위한 ‘명의’들의 진지한 표정이 온전히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다.
책에는 ‘5대 암’ 등 보편적인 질환을 중심으로 열여덟 명의 ‘명의’가 실렸다. 추덕담 PD는 그 중 본인이 연출한 뇌졸중 전문의 오창완 교수 편을 집필했다. 지금은 다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지만 추 PD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명의>와 함께했다.
<명의> 집필에 참여한 PD와 작가들은 바로 곁에서 ‘명의’를 지켜본 인간적인 감상과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다.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 제의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5월. 프로그램 제작과 원고 작성을 병행하는 것이 필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1년 반 만에 책을 냈다. 의학용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책의 ‘주인공’들에게 최종원고를 확인받는 ‘쑥스러운’ 에피소드도 있었다.
추덕담 PD는 “명의는 명예로운 호칭이지만 의사들에게는 ‘감옥’과 같다”고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들은 전국의 전문의 1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각 분야에서 이미 최고로 인정받은 의사들이다. 하지만 방송에 ‘명의’로 소개되고 나면 의사들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고달픈 ‘감옥’으로 들어가 새로운 치료법이나 수술법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바쁜 의사들이지만 ‘의외로’ 제작진에 협조적이다. 추덕담 PD는 “환자들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여부만 궁금해 하지만, 의사들은 질병치료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터뷰에 잘 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제작진은 짧게 6주에서 길게 18주 동안 의사들을 동행 취재하며 ‘반 의사’가 된다. 추덕담 PD는 응급환자가 많은 뇌졸중 편을 제작할 때 의사들과 똑같이 ‘응급호출’을 받았다. 그는 “집에 있다가도 새벽에 호출메시지가 오면 혼자 6mm 카메라를 뛰어갔다”며 “뇌졸중 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추덕담 PD는 인터뷰를 마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명의라고 해서 모두 환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에 대한 열정은 모두 같으니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죠. 인정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의사도 사람입니다. 만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독이다보면 견디기 어렵죠. 의도적으로 일과 개인생활의 경계를 두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곁에서 지켜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