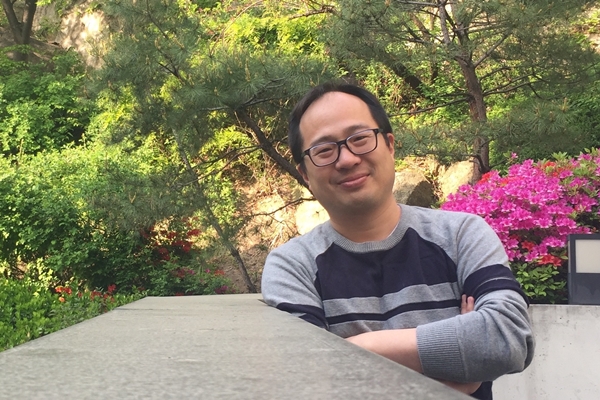[PD저널=안수영 MBC 예능 PD] 파업하기 싫었다.
천성이 남과 부딪히고 싸우는 걸 무서워하는 쫄보인데다가,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도 이제 막 상승세를 잡았는데 오랜 결방이 미칠 영향 또한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5년 전에도 싫었다. 하던 일을 놓고 월급도 못 받는데 낭만에 빠져 파업에 들어갈 노동자가 누가 있으랴. 그래도 그때는 주저함보다는 확신이 더 컸다. 5년 전에 떠돌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MBC노조는 진 적이 없다.” 입사한 이후 크고 작은 파업을 했었지만 지고 다칠까 봐 무서웠던 기억은 없었다. 대의를 세우면 힘을 모아 이기고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기는 습관, 그것을 우리는 5년 전에 잃었다. 지는 것도 모자라서 처절히 찢겼다. 그 후 언젠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내 머릿속에 한가지가 명백했다. 다시 파업하면 지면 안 된다. 또 지면 정말로 습관된다.

총파업의 전조가 보이던 몇 주 간 동료들 사이에서 필수코스로 여겨지던 <공범자들>을 선뜻 보러 갈 수 없었던 것도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다. 트라우마를 목도하는 순간이랄까. 아직도 생생한 그 연대감, 그리고 뒤이은 열패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그걸 어찌 불 꺼진 극장에서라고 태연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지난 2년 간 MBC 예능국에선 스무 명 가까운 동료PD들이 회사를 떠났다. 평생 같이 회사를 다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동기와 후배들이 도미노 쓰러지듯 한도 끝도 없이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어차피 붙잡지 못할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즈음부턴가는 어떻게든 붙잡아 봐야겠다 생각도 했다. 일상화된 간섭이 횡행한 지 오래인 예능국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없나 고민도 했고, 우리끼리 밥이라도 더 자주 먹으면 서로를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순진한 척 눈길을 돌린다고 어찌 모를 수 있을까, MBC가 지금처럼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만 않았어도 사라져간 동료들의 절반은 한번 더 마음을 다잡았을 거란 걸.
경영진은 PD들이 돈을 좇아 떠나니 방도가 없다 단정짓고 비웃었지만, 이제껏 예능PD에게 MBC 바깥의 유혹이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예전의 MBC는 그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자랑스러운 이름이었고, 지금의 MBC는 유혹을 내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텅빈 이름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매일 출근하며 겉만 눈부신 상암동 건물을 올려다 볼 때, 인트라넷에 접속하자마자 팝업되는 쪽팔린 슬로건과 회사특보를 외면하기도 치칠 때, 한때 찬란했던 동료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검은 얼굴들을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때, 나도 수없이 생각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나도 이리 싫은데 먼저 떠난다는 이들을 무슨 수로 막으리.
갑자기 퇴사를 결심하고 번개처럼 모인 송별회 자리에서 잔뜩 술에 취한 후배는 나를 껴안으며 귓속말로 울었다. “What have I done? 형,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요?” 입사 때부터 서로를 지켜보며 인생과 미래를 얘기했던 동기는 이직 후에도 만날 때마다 MBC 마지막 시절의 자신을 연민했다. 자기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몇 달에 걸쳐 미움을 눅이던 그를 보며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파업하기 싫었다. 하지만 행동해야 했다.
피맺힌 동료들의 설움에 더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타의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을 풀 수 있는 회사, 자의로 떠난 사람들이 맘 편히 그리워할 수 있는 회사, 그런 MBC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책이었다.
총파업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공범자들>을 봤다. 5년 전 나만큼이나 힘들었던, 그래서 다시는 파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아내와 함께였다. 두려워했던 대로 영화를 보는 내내 아팠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에게, 나도 저기 있었어, 맨 뒷줄이어서 보이진 않는데 나도 있었어, 라고 으스댔지만, 다른 관객들이 실소할 때 나는 웃음이 1도 나질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아내가 한줄평을 했다. “파업해서 회사 바꿔야겠네.”
파업이 시작되고, 거짓말 같이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고, 목쉰 구호가, 익숙한 팔뚝질이, 뜨거운 노랫가락이 다시 요 한 달의 일상이 되었다. 5년 전과 달라진 것도 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싸우던 어떤 동료들이 지금은 없다. 그때는 학생이었다는 후배들이 지금은 같이 싸운다. MBC에 들어온 뒤 자기들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소속감과 당당함을 나누며 젊은 그들과 나는 다시 전선에 선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파업하기 싫다. 사상 최장의 연휴라는 추석도 부담스럽고 싫다. 얄팍한 통장잔고도 벌써 바닥나 5년 전 대출받았던 그 은행직원에게 또 인사하러 가기 싫다.
그러니 회사를 망친 당신들은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제 그만 일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