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저널=오학준 SBS PD] “불의 참된 아름다움은 책임과 결과를 없애버린다는 데 있지.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화로에다 던져 버리면 돼.”
올 한해 책상 위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 없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에 나오는 이 한 문장에, 나는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불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성을 기꺼이 불태울 화로를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반세기 전 저자가 우려하던 그 디스토피아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책을 읽으며 내가 바로 바보상자를 만드는 헤파이스토스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화씨 451>은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필요해진 시대, 책은 읽히기보다 불타기 위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화수(放火手) 몬태그의 이야기다.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된 시대, 몬태그는 몰래 책을 숨긴 사람들을 적발하고 그들의 책을 불태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그의 상사 비티는 장광설을 늘어놓기 좋아하며,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를 따라 몬태그 역시 읽어본 적 없는 위험한 물건인 책들을 묵묵히 태우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일상이 한 노파의 죽음으로 완전히 뒤바뀐다. 어느 날 밤 숨겨둔 책들을 불태우던 중,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 책을 껴안고 노파가 죽어버린 사건이 발생한다. 불길 속에서 외친 노파의 마지막 비명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몬태그에게 비티는 마치 책 속에 담긴 각주를 읽어주듯 그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 순간 몬태그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혼란 속에 빠진다. 그의 말 뒤편엔 상당히 많은 독서의 시간이 가라앉아 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자신의 과거를 불태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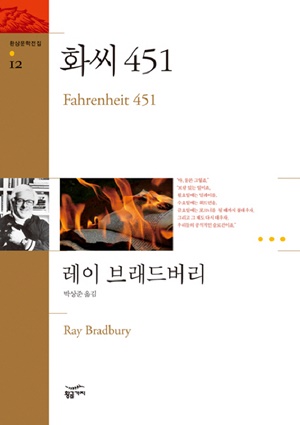
작은 의문은 몬태그를 추동하고, 결국 그는 책을 태우던 방화수에서 책을 숨어서 몰래 보는 범죄자가 된다. 그런 그의 책들을 불태우기 위해 조여 오는 비티의 추적에 몬태그의 비밀은 결국 발각되고, 그가 숨겨두었던 책들은 잿빛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또 다른 불기둥이 된다. 그리고 그 때, 비티 역시 몬태그가 놓은 불에 죽음을 맞는다. 비티는 별다른 저항도 없이 책들처럼 잿더미가 된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몬태그의 깨달음과 변화에 좀 더 주목한다. 어쩌면 저자도 같은 생각을 하며 이 책을 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내가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감정을 이입하고, 마음을 상상했던 인물은 비티였다. 그는 어째서 자신의 독서 배경을 누설하듯 몬태그에게 정보를 일러주고, 그로 인해 결국 책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일까?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떤 풍경들로 가득했을까.
물론 소설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상상의 몫을 떠맡은 독자는 고민에 빠진다. 책에 더 이상 정확한 사실들이 실리지 않아 실망해서였을까? 아니면 책을 넝마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을까? 나쁜 책들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체념 때문이었을까? 책을 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책을 읽었지만 무력하게 세계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을까? 어떤 감정을 상상하든, 비티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낸 흔적을 배신하며 산다. 배신의 끝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책을 불태워야만 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계, 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앞장서서 책을 불태웠지만, 비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아름다웠던 과거도 태우고 잊어버려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 의미를 잃고 매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던 그가 책을 몰래 숨긴 범죄자가 자신의 부하인 몬태그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의 사건을 기획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을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그가 불길 속에 자신을 내던지듯 타들어갈 때, 나는 그가 견뎌내던 모순적인 삶의 무게를 곱씹어보았다. 무게는 다르겠지만,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건들을 알리고, 사람들이 봐야 할 정보들을 보게 하고 싶어 선택한 직업이지만, 종종 그 선택은 쉽고, 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해야 한다면 남는 건 잿더미뿐일지도 모른다.
"보육원을 나와서 대학에 들어갔다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거네. 지난 5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지적인 문화 형태라는 건 그런 식이었네.“
비티의 말처럼, ‘대학’의 경험을 가지고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비티가 느꼈을지 모르는 그 고통은 분명 작가의 것이다. TV가 도래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던 그 시기, 작가는 비티의 입을 빌어 문명의 우울한 미래를 그렸다.
그리고 나는 그 우울한 미래를 열심히 잿빛으로 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을 읽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자괴감'뿐이다. 나는 지금 어떤 색으로 세상을 칠하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