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책 소개는 잠깐 접어두고, 요 몇 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7년 여름에 출간되어 화제를 일으켰던 박권일과 우석훈의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있었다. 386세대를 정점으로 하는 40대가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20대와 50대가 비정규직의 ‘88만 원짜리’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라고 말하는 <88만원 세대>의 현상 분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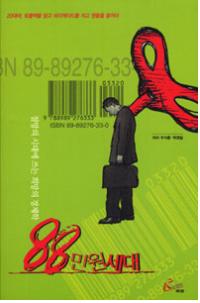
<88만원 세대> 출간 후 2년의 세월이 지나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 변희재는 2009년 1월 27일'실크 세대론과 88만원 세대론의 소통을 위하여'라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386세대가 경제적 헤게모니를 놓지 않아서 창의적이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실크세대’가 ‘88만원 세대’의 덫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범으로 386세대 중에 자신이 언제나 겨냥하는 진중권을 다시금 지목하고 386세대의 혁파를 중요한 임무라 말했다.
그러자 우석훈이 변희재한테 ‘낚였다’라고 주장한 <88만원 세대>의 공저자 박권일은 레디앙에 ‘세대론’이 책을 팔기 위해서 ‘당의’(설탕을 입힌 것)이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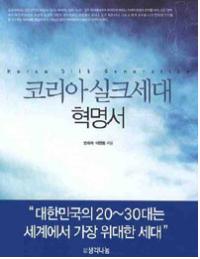
논쟁에서 누가 우위를 지니고 있는 지는 읽는 이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쟁의 우위 그 자체가 아니다.
웃기는 사실이 있다. 실제로 위의 매체들에서 벌어진 주요 논쟁에 엮여 있는 당사자 가운데 ‘88만원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윤형 정도밖에 없다. 다른 모든 사람은 <88만원 세대>에서 가장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386세대’에 해당되는 세대의 구성원이다. 한동안 논쟁의 밑바닥에서는 ‘88만원 세대’의 냉소가 흘러내렸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88만원 세대’ 중에서 <88만원 세대>를 읽는 사람은 서울 명문대학의 상경계열의 ‘확정된 미래’가 보이는 대학생이라는 것. 그들은 <88만원 세대>를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스펙쌓기에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고 말한다.
주위에 불안정 노동으로 ‘임금 88만원’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알바 인생’, '비정규직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의 절대 다수는 <88만원 세대>를 읽지 않았다. 아니,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자체를 모른다!
중요한 것은 <88만원 세대>를 가지고 ‘세대론’이냐 ‘계급론’이냐, 혹은 누구의 탓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20대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까?
더 치명적인 것은 20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다는 거다. 개인적 저항은 정점으로 치닫고 사이코 패스의 시대가 오고 있지만, 하나의 집단적 형태의 ‘청년의 말’은 없어진 듯하다. 어떤 입장이든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다. 각자 살기로 단단히 맘을 먹고 스펙 놀음과 ‘공시’, ‘고시’에 올인한 듯하고, 그리고 그나마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안한 숱한 20대들은 ‘사회적 문제’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난 386세대가 부럽다. 그리고 유럽의 68세대가 굉장히 부러운데, 그건 그들의 정치적인 ‘급진주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20대 내내 하고 싶은 대로 잘 놀았다는 것 때문이다. 386세대들이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엄혹한 독재의 시대가 그들을 짓눌렀다고 하는 말의 진정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승리’의 순간을 맛보지 않았는가? 제도권 교육이 아닌 길거리의 자신들이 만드는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가? 자신들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를 거리에서 울리게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68세대, 그들은 바리케이드로 도로를 막고 혁명과 사랑을 동시에 외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인 ‘혁명과 사랑의 시대’를 안다고 하여서,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대를 공유했던 이들의 추억담은 어느 순간 ‘교조’가 되었고 ‘민주화’라는 환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대를 규정했던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건 지금 20대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존의 구조에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20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모두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목소리는 '20대'를 규정하려고 드는 오지랖 넓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우리 자신, 20대의 목소리가 아닐까?
대중 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자.
한동안 홍대 인디 레이블의 바람이 불었다. ‘장기하와 얼굴들’, ‘브로콜리 너마저’, ‘W & Whale’ 등의 밴드들, 그리고 기존의 ‘언니네 이발관’, ‘델리스파이스’ 등의 재발견. 거대한 대형 기획사에서 ‘시장성’의 이유로 거부했던 그들은 자신의 방에서 홈-레코딩을 통해 음반을 녹음했다. 그리고 소소한 클럽에서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공연을 했다. 생활비와 연습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손가락이 잘리도록 노동했다(타바코 쥬스의 보컬).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졌고, 이제 그 세계의 출입문은 쉽게 닫을 수 없는 것이 되어간다.
며칠 전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책을 읽었다. 한 글귀가 생각이 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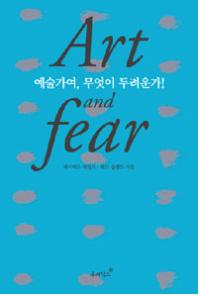
최소한의 ‘화를 풀’ 공간도 없는 지금 20대에게 필요한 건, 김현진의 말마따나 〈당신의 스무살을 사랑하라〉가 아닐까? 극한으로 몰려있는 20대를 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 대답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는 상황에 놓인 20대가 스스로 모색해봐야 하지 않나?
20대여, 노래로든, 춤으로든, 그림으로든, 이제 우리의 말을 하자! 이제 좀 그럴때가 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