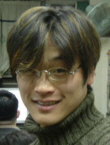
누가 취미생활을 묻는다면 ‘이력서 쓰기’라고 답할 정도로 많은 이력서를 썼고(어제도 하나 썼다) 매번 연락이 오지 않는다. 경제 불황과 매체, 글품 팔기에 대해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사실 할 얘기 많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조용한 음악을 즐겨 듣는다. 내 기준에 ‘조용한 음악’이란 보통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클래식도 포함되는데 좀 더 세분화하자면 ‘클래시컬한 록 음악’이다. 잉베이 맘스틴의 바로크 메탈을 떠올리진 말자. 지금은 21세기니까.
내가 즐겨듣는 건 포스트 록, 혹은 익스페리멘틀 록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음악이다. 몇 년 전 파스텔 뮤직에서 ‘에곤 쉴레를 위한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라이센스한 레이첼스가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밴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밴드에는 전기기타나 드럼이 없다. 대신 첼로,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등 실내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록 밴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재현이 아니라 레코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클래시컬 음악은 거장들의 악보를 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록 음악은 레코딩이 중요하다. 라이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기본적으로 록 음악의 탄생은 레코딩 스튜디오 앨범의 탄생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걸 상기하자. 그러므로 실내악 구성의 밴드라도 그들의 음악이 사운드 레코딩과 믹싱에 근거한다면 록 밴드가 될 수 있다. 록 음악의 정의를 확장시키면 쉬운 문제다. 포스트 록이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 장르다. 록 이후의 록 음악,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멜로디가 아니라 악기 자체, 실제 악기 소리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변형된 노이즈에 집중하는 사운도도 많다.

이런 밴드들의 음악은 기승전결이 비교적 뚜렷하다. 보통 5분 이상, 길게는 10분 이상의 곡들이 많은데 낮은 음의 아르페지오에서 시작해 천천히 상승하면서 몇 차례 머뭇거리는 듯 우물쭈물 애간장을 태우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뭐 그런 구성이다. 대부분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희박하기 때문에 사운드에 집중하기가 더 쉽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크게 높이면 우주 공간을 혼자 외롭게 떠도는 기분도 든다. 그래서 번잡함이나 뭐 거시기한 것들도 금방 잊게 된다. 최근에 또 하나 깨달은 건, 이런 종류의 음악이 ‘정신을 맑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성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이런 음악은 때론 영적인 감흥을 준다. 성가나 찬송가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음악이 어떤 영성을 전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이건 분명히 영혼을 각성시키는 소리다. 그래서 기껏 제트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주제에 나는 가당치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열심히 살게 된다. 과연, 내가 이력서를 왜 썼던가. 과연, 내가 공존을 생각했던가. 과연, 누군가에게 한번이라도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김영승의 〈반성〉도 떠오르고, 안도현의 〈연탄 한 장〉도 떠오른다. 그러니까 유익하다. 바야흐로 실용적인 음악인 셈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용적인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진다. 실용은 사실 반성 후에 가능하다. 반성은 돌아보는 것이고, 돌아보는 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앞으로 나가고자 할 누군가는 반드시 잠깐 멈춰 뒤돌아 봐야한다.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자기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분들, 이왕이면 청기와 집에 살고 계신 분들과 여의도에 기거하시는 분들과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 분들이야말로 이 타이밍에 절대적으로 반성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군다고 바쁜 경찰들이나 이리저리 불러대지 말고 가만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면 세상도 달리 보일 것이다. 영혼이란 게 아직 거기에 있다면 말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