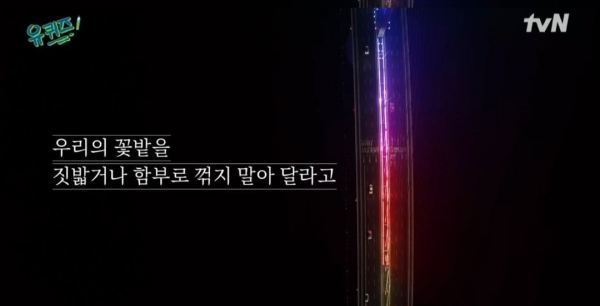
[PD저널=김현지 MBC경남 PD] 대통령 당선인이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갑작스럽게 출연했고 곧이어 제작진의 불편한 마음을 담은 제작일지가 방송됐다. 이것은 제작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각오를 하고 당근을 흔든 것인가 아닌가,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감성팔이 자기변명 아닌가 등등 <유퀴즈>를 둘러싸고 몇 주 째 시끄럽다.
사실 그간 많은 인터뷰 프로그램이 인물 홍보용으로 이용되어 온 사례가 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기업인과 같은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통령 당선인이 끼어들었다면 아쉬움 정도로 그쳤을 것이다. 어쩌면 수많은 짤을 만들어내며 뜻밖의 긍정적 효과를 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 당선인, 얼마나 좋은 이슈인가.
하지만 <유퀴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이'라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다. 평소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목소리들을 직접 듣고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따듯하고도 재미있게 풀어내 왔다는 시청자와 제작진 모두가 공유하는 자부심이 있다. 시청자들이 유독 <유퀴즈>의 상황에 더 흥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스피커의 기능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송출하는 스피커. 우리들의 본진에 노크도 없이 들이닥쳐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던 것이다.

박완서 작가가 <도둑맞은 가난>(1975)에서 명쾌하게 꼬집었듯, 가난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난 그 자체를 탐내지 않는다. 가난에서 연상되는 애수, 그 감성만을 탐낼 뿐이다. 평범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소박한 존경심까지 빼앗아 가고 싶은 것이다. 물론 당선인 측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나 제작진의 각오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평범한 이들의 감수성을 훔치려는 의도조차 없었을 수 있다. 그저 가장 유명한 MC가 진행하는 가장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했을 뿐일 수 있다. 그건 그 자체로 더욱 절망적이지만.
어떤 인터뷰는 인터뷰이뿐만 아니라 인터뷰어의 인생까지 바꿔 놓는다. 그저 아이템이 된다는 생각에 관성에 젖어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언론인, 방송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하고도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좋은 인터뷰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들어가는 여행과도 같다. 그리고 인터뷰어는 결코 그 인터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강남에서 태어나 8학군을 거쳐 SKY를 날아 대기업 언론사에 안착한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라도 매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곱씹으며 편집하고 자막을 쓰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가 바뀌게 된다. 내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작고 얕았는지, 나는 얼마나 안락하게 살아왔는지, 나의 인생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으며 그럴 때 평범한 누군가가 구원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일주일이 한 달, 1년, 2년이 되면 결국 제작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한 사람이 바뀌면 언젠가 세상도 바뀐다.
방송은 순수한 예술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이 진지한 저널리즘은 아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시간, 같은 포맷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방송쟁이들만의 저력이다. 흔히 ‘찍어낸다'고 폄하하지만 납품기일을 맞춰 성실히 루틴을 수행하는 평범함은 아무리 훌륭한 다큐멘터리스트라 할지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힘이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방송사와 편성표에 매인 입장이지만 현장을 공유한 제작진만의 슬픔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다짐이 있다. 소박한 꽃밭을 지키고 싶은 방송계의 꽃들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말해 주고 싶다.
